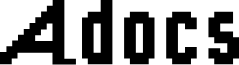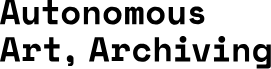단서들
출판물 정보
기획: 박이슬
작가: 김샨탈, 송유나, 이희경
리뷰: 김강리, 문지호, 양은희, 정윤선, 채은영
번역: 김샨탈, 문지호
디자인: 슈퍼샐러드스터프
페이지수: 128
발행처: 임시프레스
발행연도: 2024
ISBN: 979-11-90792-08-0 (03600)
후원: 인천광역시, (재)인천문화재단, 시작공간 일부
* 본 도서는 인천광역시와 (재)인천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2024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발간되었습니다.
작가소개 & 출판물 소개
김강리
메갈리아 세대의 페미니스트이자 비규범적 욕망을 말하는 퀴어로서 예술과 윤리의 교차점에서 ‘더 나은 삶’을 사유하고자 한다. 《Surface Tension》(중간지점 하나, 2022)와 《구름 그림자》(성북예술창작터, 2021)에 참여하였고, 《기묘한 집》(임시공간, 2023)과 《유랑하는 도시의 산책자》(트라이보울, 2022)를 기획했다. 큐레이토리얼 실천을 연구하는 cyl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프로젝트 스페이스 Garage Under Construction(약칭 G. U. C.)을 공동운영한다.
박이슬
‘전시’라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사건이 특정한 맥락과 실천에 놓일 때 사회-정치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으로 큐레이터학을 공부했으며, 망각에 대항하는 예술의 가능성을 고민한다. 말을 건네기 위해 전시를 기획하고 가끔 글을 쓴다. 전시 《침묵의 도면》(임시공간, 2023)과 《푸른 낮의 필사》(임시공간, 2022), 책 『단서들』(2024)을 기획했다.
문지호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소설가, 화가, 연구자 그리고 인디듀오 펠트의 멤버이다. 비/반학제적 수행, 탈식민적 지식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양은희
주로 전지구화, 젠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주제로 현대미술을 연구해 왔으며 2009년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등 여러 전시를 기획했다. 「왜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는 지속가능할 수 없었는가?」(2019),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서 본 한국미술의 세계화와 코스모폴리타니즘」(2017)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 『현대미술 키워드 2』(2024, 공저), 『현대미술 키워드 1』(2022, 공저), 『디아스포라 지형학』(2016, 공저)을 냈다.
정윤선
예술인의 사회-정치적 조건과 작품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전시’와 ‘작품’을 폭넓게 해석하고자 한다. 예술가를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 위에서 맥락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순응하지만은 않는, 개인과 동시대의 교차점이 되는 중요한 존재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술 비평 및 연구를 중요한 실천으로 지속하고 있다. 2019년부터 브런치 사이트에 미술 글쓰기를 해왔으며, 석사논문으로 「‘#미술계_내_성폭력’ 운동의 페미니즘 미술 전략으로서 장소의 정치: ‘루이즈더우먼’을 중심으로」(2024)를 썼다. 제6회 GRAVITY EFFECT 미술비평 공모 2위(2023)를 수상하였다. 인터뷰집 『오래 나눈 이야기』(2022)를 기획하고, 전시 《교-차-점 交叉點》(三Q, 2021)을 공동 기획했다.
채은영
통계학, 문화예술경영, 미술이론을 공부했고, 도시 공간에서 자본과 제도의 불온한 긴장관계를 가진 시각예술의 실천에 관심이 많은 연구-기획자이다. 갤러리 보다, 대안공간 풀, 우민아트센터에서 일했고, 트랜스-로컬리티와 생태-정치 주제의 리서치 기반 ‘임시공간’, 독립출판사 ‘임시프레스’, 인터-로컬 웹진 ‘동무비평 삼사’를 운영하는 예술 자영업자다. 이동석 전시기획상(2013)을 수상했고, 쌈지스페이스, 경기창작센터,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에 참여했고, 다수의 전시, 공공 프로젝트, 아카이브, 출판을 기획했다.
출판물 소개
전시 《침묵의 도면》(임시공간, 2023)의 전과 후를 돌아보며 엮은 책 『단서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열린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와 그 이후의 전시를 다양한 맥락으로 읽어낸 다섯 “공모자들”의 글과 전시의 준비 과정에서 수집한 “이정표”를 수록했다. 문지호는 남성적 역사의 바깥에서 전승되어온 망토 아소자바 투피남바가 등장하는 단편 소설을 통해 몸에서 몸으로, 여성이 지식의 전달자가 된 이야기를 전시에 포개어 놓는다. 이어 정윤선은 역사 안과 밖의 여러 존재들 사이 관계를 돌아보며 입체적인 역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할 질문들을 제시하며 김강리는 세계를 마주하도록 하는 ‘고통’과 우리를 조직하고 추동하는 ‘분노’를 지나 절대적 ‘환대’를 가능하게 하는 힘에 대하여 말한다. 앞선 공모자 3인이 지나간 비엔날레를 상상하며 각자 다른 방식과 시선으로 《침묵의 도면》을 읽어냈다면, 남은 2인은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를 직접 목도했던 공모자로 등장한다. 양은희는 2000년대 초반 페미니즘 미술의 계보 안에서 중앙 바깥의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가 갖는 의의에 관한 에세이를 적었으며, 임시공간에서 리서치 베이스 큐레이팅을 실천해온 채은영은 그의 궤적에서 만난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를 복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