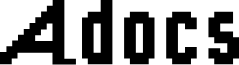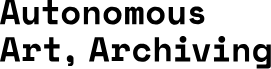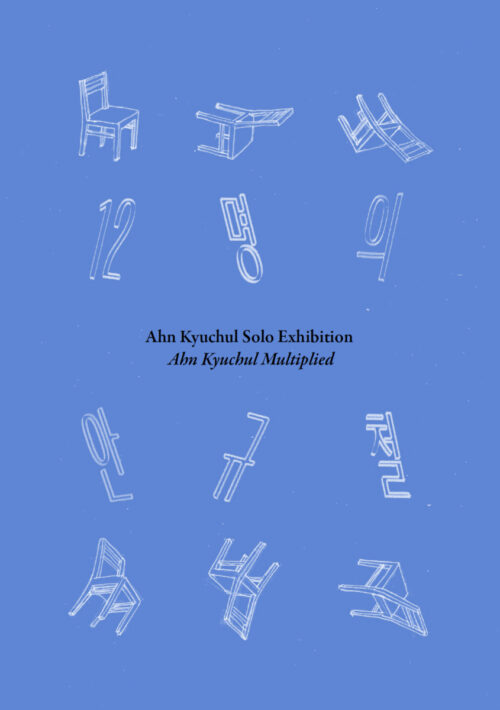Summerspace
출판물 정보
«Summerspace»
2024년 4월 27일 – 5월 11일, Hall1
기획: 유승아
참여 작가: 김유자 박보마 이나하 함혜경
글: 김리윤 안규철
그래픽 디자인: 마카다미아 오
사진: 스튜디오 아뉴스
장비: 올미디어
설치: 정황수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작가소개 & 출판물 소개
«Summerspace»는 ‘잠재성’이라는 개념어를 공간에 펼친다. 윤슬처럼 눈부시며 찰나에 아스러지는 순간. 무언가가 제 모양을 이루기 직전에 머무는 곳. 전시는 이를 초여름의 계절감에 빗대어 상상한다. 어린 열매, 열도를 높여 가는 햇볕, 알록달록한 생기. 낭만적이고 야망에 찬 순간은 한편으로, 금세 지고 말 것이라는 우울과 불안이 깃들어 있다. «Summerspace»는 실상 그 계절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 시기를 지나는 행위와 감정을 담는다. 의도했음에도 어긋나는 것들과 뜻하지 않게 이룬 것들 사이에서, 잠재성을 내포한 순간들과 그 찰나의 정서를 마주한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속에 숨어있는 성질을 꺼내어 공간으로 만든다. 미래는 공간으로 열린다.
전시 도록『Summerspace』는 전시의 입구가 되어 주었던 김리윤 시인의 “우리의 여기의 이것의”와 함께, 전시의 또 다른 출구가 될 안규철의 “그대도 말하라”가 수록되어 있다.
–
김리윤은 언어를 기반으로 이미지의 생성과 전달, ‘보기’에서 파생되는 관계에 주목하는 작업을 한다. 개체와 사물, 매체 각각의 의지와 이미지가 중첩될 때 일어나는 경험에 관심이 많다. 물질과 비물질, 감각을 포함하는 이미지의 재료를 탐구하며, 이미지 안팎에 의도와 우연이 뒤섞일 개방된 공간을 만들어 두고자 한다. 시집 『투명도 혼합 공간』(문학과지성사, 2022)를 출간했다. 시의 이미지와 시각 매체에서 다뤄지는 이미지 사이의 교환과 발생, 유실을 탐구하는 개인전 «새 손»(리:플랫, 2023)을 개최했다. 동료 시인 김선오와 함께 웹 기반 연재 플랫폼 아지테이트(agitate.site)를 운영한다
김유자는 한 장으로 압축된 사진의 이면이 유도하는 상상력에 주목한다. 사진에서 본 것과 볼 수 없는 것은 경험과 사건, 우연과 연출, 다양한 지지체를 경유해 화면에 자리한다. 2023년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사전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서울〉 비평 지원에 선정되었고, 개인전 《시스터 시티 : 지도의 바깥》(스페이스 카다로그, 2023)을 개최하였다. 《흰 작살을 머금은 바다》(서리풀갤러리, 2024), 《2023 Anti-freeze》(합정지구, 2023), 《새로운 조망》(주한독일문화원, 2021), 《Frankie》(N/A, 2021), 《2020 미래작가상》(캐논갤러리, 2021) 등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박보마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감각을 빛과 물질에 비추어 보는 일을 한다. 이를 위해 분위기(인상, 기분, 순간, 느낌 등)의 물질성, 힘 그리고 그의 반복(복제)을 탐구하며 다양한 매체와 증식적인 아이덴티티를 경유하여 외부적 사건으로 재현, 발화하기를 모색한다. 최근 가상의 회사 «Sophie Etulips Xylang Co.,»(2021)의 웹사이트(s-e-x-co.com), «Mercy, Boma Pak: Paintings and Matters 19xx2022»(YPC SPACE, 2022) 그리고 «물질의 의식(리움에서)»(리움 미술관, 2023), «Baby»(PS 사루비아, 2023)을 개인전시로 선보였다. «즐겁게! 기쁘게!»(아트선재센터, 2023), «마이셀리아 코어, 레버카 손, 폴 앤 스티브»(수치, 2022), «Girls in Quarantine»(2020), «장식전»(오래된 집, 2020), «Defense: …»(d/p, 2020), «Shame on You»(두산갤러리 뉴욕, 2017), «실키 네이비 스킨»(인사미술공간, 2016)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안규철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고, 중앙일보 『계간미술』에서 7년간 기자로 일했다. 1985년에 ‘현실과 발언’에 참여하면서 풍자적 미니어처 작업을 선보였고, 1987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 이듬해 독일로 이주,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학교에서 7년간 수학했다. 1992년 스페이스 샘터화랑 개인전 이후 『사물들의 사이』, 『사소한 사건』,『49개의 방』, 『무지개를 그리는 법』,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당신만을 위한 말』, 『사물의 뒷모습』 등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국내외 기획전에 참가했다. 일상적 사물과 공간에 내재된 삶의 이면을 드러내는 미술작업과 글쓰기를 병행해왔고, 1997년부터 20여 년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저서로 『그림 없는 미술관』, 『그 남자의 가방』, 『아홉 마리 금붕어와 먼 곳의 물』, 『사물의 뒷모습』이 있고, 작품집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과 함께, 『몸짓들: 현상학 시론』(빌렘 플루서), 『진실의 색: 미술 분야의 다큐멘터리즘』(히토 슈타이얼) 등의 번역서를 냈다.
유승아는 가장자리에서 경계를 흐리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가치에 관심이 있다. 서로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매체들이 느슨하게 뒤엉켜 그 자체로 이야기를 만드는 전시의 방법론을 실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능한 미학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을 탐구한다. 《꿀꺽》(두산갤러리, 2024), 《원본없는 판타지》(온수공간, 2023), 큐레토리얼 프로젝트 〈How Does Performance Art Work?〉(2023), <호모 아르스>(2023)를 기획 및 공동 기획하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레지던시(2022)에 다이얼로그 연구자로 참여한 바 있다.
이나하는 뚜렷한 형상보다 흩어진 형상, 흐릿한 형상, 경계가 불분명한 형상을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 물감을 캔버스 천 위에 채워 넣은 후, 캔버스 천을 밀거나 접거나 당기는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만든다. 대상과 배경의 위계가 없어지고, 형태와 배경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방식의 그리기를 시도한다. ‘자국 회화’ 연작은 물과 수영하는 사람을 소재로 이러한 그리기의 방식을 시도한 결과물이다. 개인전 《RESIZE》(2018, 원룸 ONEROOM)을 비롯하여 《미적감각(美的感覺)》(2024, 서울대미술관), 《俱具(구구)》(2023, 카페 온), 《스티키(sticky)》(2022, 무목적), 《말괄량이 길들이기》(2022, 뮤지엄헤드), 《오늘들》(2021, 영주맨션)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함혜경은 이미지와 텍스트(보이스)가 불러일으키는 감정들 – 지나간 시간, 권태, 불확실, 상실, 실패같은 것들에 주목한다. 허구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을 구성하고, 그것에 대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을 텍스트로 옮겨 비디오 안에서 말하게 한다. 현재에서 과거로, 외부에서 내부로 자유롭게 오가는 이야기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거나, 각자의 상상 속에서 다른 장면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PAUSE, REWIND, PLAY》(2021, 경남도립미술관), 《평온의 섬》(2020, 백남준아트센터 이음-공간), 《의문의 가장자리》(2019, 갤러리 룩스) 외 개인전, 《대구현대미술제》(2023, 강정보 디아크), 《시적소장품》(2022, 서울시립미술관), 《직면하는 이동성:횡단/침투/정지하기》(2022, 아르코미술관), 《제47회 서울독립영화제 뉴-쇼츠》(2021, CGV압구정) 외 그룹전 및 스크리닝에 참여했다.